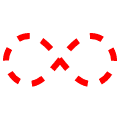[취재수첩]

남상욱/취재부
아주 오래 전 어느 해 12월 한 선배와 송년회에서 주고 받은 대화가 떠오른다. 당시 그 선배는 모 일간지 기자였고 나는 '참된 기자'를 꿈꾸고 있던 대학생이었다.
나는 한국의 언론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던 중 그 선배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기자란 무엇인가?"
'사회의 목탁',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어줍잖은 답을 뒤로 한 채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는 독자를 대신해서 해보는 사람이다."
오래 전 매우 사적인 경험을 기억해낸 이유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려는 마음 때문이다. '올 한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자기 반성은 곧 '기자답게 한해를 보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오래 전 선배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2월이 되면 시간의 흐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쉬움이 몰려온다. 연초에 마음먹고 계획했던 것들을 절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에 그냥 그렇게 한 해를 흘려 보낸 것이 아닌가하는 회한이다.
특히 내가 쓴 기사들이 독자들을 대신해서 해보는 사람이 쓴 기사였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독자는 모든 곳에 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고 기사에 이를 담아냈는가.
그래서 독자가 보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 만져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따져 보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드러냈는가.
답을 내기가 쉽지 않다. 다른 신문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나 상황들을 좀 더 깊고 다양하게 전하려 고심하고 애를 썼지만 결코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독자를 대신해서 해보는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는지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연말이다.
그나마 이런 반성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내년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 이유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사에 대해 독자들이 보여준 다양한 반응들이 희망의 단초들이다. 색깔론은 물론 기사 오류 정정, 지지와 응원, 비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이 보여준 관심과 반응들 말이다.
기사가 완벽해서, 또 기사를 잘 썼기 때문에 보내 준 성원이라기 보다는 불완전하기에 더 잘하라는 격려일 터.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을 맞이하는 길목에서서 다시 한번 물으며 각오를 다잡는다.
"기자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