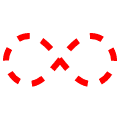(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백의의 천사'가 나란히 남은 가족들과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29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김라희(37·여)씨와 김점자(49·여)씨 발인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농협 장례식장에서 김라희 씨 유족 20여명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간호조무사였던 김라희 씨는 세종병원 화재 당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다 숨졌다.
정식 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 간호학과에 지원하기도 했던 그는 합격자 발표도 보지 못하고 병원을 덮친 화마에 변을 당했다.
평소 쾌활한 성격이던 그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남편과 입맞춤을 했을 정도로 금슬도 좋았다.
화재 당일인 26일 김 씨는 출근 30여분 만에 '살려달라'는 전화 두 통을 남긴 채 남편과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남편 이모(37)씨의 작은아버지는 "추석 때 라희를 만나 이제 아기를 가져야 할 때 아니냐고 물으니 '계획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며 "애교도 많고 씩씩한 아이가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니 상심이 너무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남편 이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심경이 아니다"며 고개를 떨궜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밀양병원 장례식장에선 김점자 씨 발인이 엄수됐다.
세종병원 2층 책임 간호사였던 그는 김라희 씨처럼 화재 당시 환자를 구하려다 유명을 달리했다.
화재 당일 그는 어머니께 "석류와 요구르트를 갈아놓았으니 챙겨 드시라"고 말한 뒤 병원으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어머니와 통화하던 김점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하던 중 "불이 났다"는 외침을 남긴 채 전화를 끊고 말았다.
김 씨 남동생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다"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발인을 시작한 두 사람의 관은 같은 장소에 나란히 도착해 화장됐다.
유족들은 각기 두 고인이 생전 살던 집을 한 바퀴 돈 뒤 농협 장례식장 화장장으로 왔다.
김점자 씨 유족이 먼저 화장장에 들어섰고 뒤이어 김라희 씨 유족이 도착했다.
화장장은 두 유족의 통곡이 합쳐지며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됐다.
김점자 씨 어머니로 보이는 유족이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라.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냐"라며 한사코 관을 보내려 하지 않아 다른 유족들이 나서 말려야만 했다.
이어 화장장으로 들어간 김라희 씨 유족들도 손으로 눈물을 훔치거나 오열하며 고인을 배웅했다.
유족 한 사람은 도중에 쓰러져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이날 화재 당시 환자들을 돌봤던 간호인력 2명을 비롯해 환자 11명에 대한 발인이 오후까지 이어진다.
밀양시, 경북 청도군, 부산시, 대구시, 김해시 등에 분산된 장례식장이나 성당 9곳에서 장례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home1223@yna.co.kr